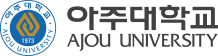아주인칼럼

어린시절 ‘받아쓰기’의 혼란스러움
한 글로 적힌 책을 읽는 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잊고 지내는 사실이 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듣고 그것을 한글로 받아 적었을 때 느꼈던 일종의 당황스러운 감정이 그것이다. 누군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말해 주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그런데 그 단어 혹은 문장을 들리는 대로 적은 결과는 여지없이 꾸중을 동반했던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 혹자에 따라서는 끝끝내 들리는 대로 적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문제아로 낙인찍혔을 법도 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보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읽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적어 낼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법과 같이 받아들이던 어린 시기에는, 물론 선행 학습이나 한글에 대한 천재적 직관으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학꾜에서 바블 멍는다’라고 적고 ‘틀렸다’는 판정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와 비슷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하고 싶다.
그 렇다면 ‘학꾜에서 바블 멍는다’라고 적는 것은 왜 틀렸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글 맞춤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난처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를 당혹스럽게까지 한 바 있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달리해 보자.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를 ‘학꾜에서 바블 멍는다’로 적지 않고 어떻게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정확하게 적어 낼 수 있었을까? 정답은 한글 맞춤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외웠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굳이 촘스키(N. Chomsky)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 많은 문장들을 모두 외우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남은 대답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한글 맞춤법의 두 원리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제 1 장 총칙의 다음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리고 그 원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더듬어 보기로 하자.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학꾜에서 바블 멍는다’라고 적은 것은 앞의 원칙 즉 ‘소리대로 적은’ 결과이고 이를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적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로 적는 것이므로 이를 좀더 분석해서 살펴보면 ‘학꾜, 바블, 멍-’은 소리대로 적으면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에서, -는다’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 다행히 어법에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를 ‘학꾜에서 바블 멍는다’로 적은 것은 첫 번째 원칙만을 따른 데서 생기는 잘못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소리대로 적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한글 맞춤법의 두 원칙을 숙지(熟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포기하느냐 하는 데 있다.